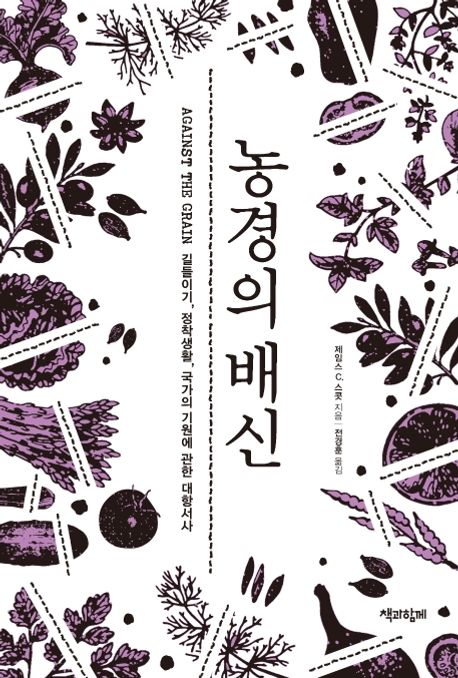농경은 인류의 삶을 더 낫게 했는가? <농경의 배신>
-
김소영
2025.08.05
-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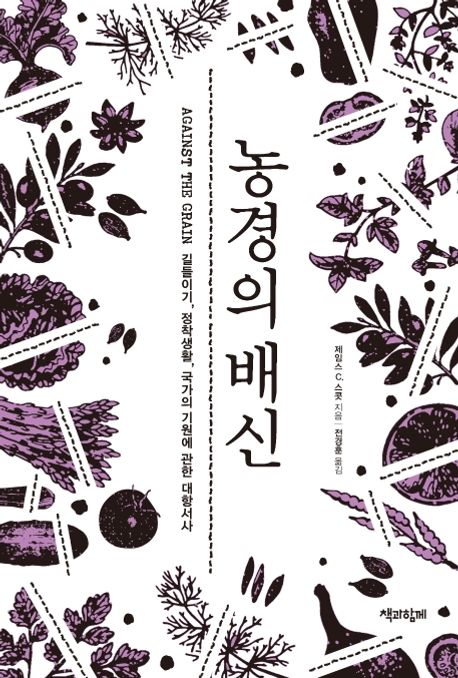
성춘택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흔히 우리는 문명과 야만을 나누며, 문명 세계에 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그러나 세상을 그렇게 이분법처럼 나눌 수 있을까? 고대문명이라 일컫는 모든 진전은 농경을 바탕으로 했다. 국가란, 농경이란 체제의 필연이었다. 그러니 농경이야말로 인류사 전환의 가장 큰 사건이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농경은 인류의 삶을 더 낫게 했는가?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던 때 사람은 더 많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이 정주마을에 살면서 불평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고통이었다. 이제 인류 역사를 더 깊고 넓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의 역작 <농경의 배신>은 본래 Against the Grain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다. 그는 주로 동남아시아의 농촌사회를 연구한 정치학자이자 인류학자인데, 선사시대, 인류학, 고고학, 역사학, 정치학을 망라하며 농경의 기원과 국가의 형성에 대한 대서사를 쓰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고고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등장과 발전에 관한 표준 서사를 상당 부분 버려야 한다. 농경과 국가의 진화를 말할 때 인간 중심의 발전 도식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 초 고고학자이자 식물학자 데이빗 린도스(David Rindos)는 순화(식물재배와 동물사육)와 농경을 동식물과 인간의 공진화 과정으로 풀고자 했다. 당시 고고학자와 인류학자는 이런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농경이란 더 나은 경제 방식이었고, 사람이 의도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동물과 식물을 길들였다는 생각이 대세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 학계는 지나치게 인간 중심의 시각을 버리고, 공진화 가설은 폭넓게 받아들인다. 나아가 스콧은 오히려 사람이 작물에 길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우리가 개를 길들인 것인지, 아니면 개가 사람을 길들인 것인가?
더는 이동하지 않고 한곳에 정주하며 씨를 뿌리고 가축을 기르며 큰 공동체를 이루고 결국 국가로 이어진다는 진보의 서사는 지나치게 편향된 것이다. 예컨대 수렵채집민은 굶주려 죽기 직전의 무법자들이 아니다. “야만인”이란 차별주의적인 이름은 그저 관리되지 않은 농경제 영역 밖의 집단을 멸시하는 용어일 뿐이다. 오히려 다양성과 복합성의 영역이었다. 약탈도 있었지만, 교역하면서 역사의 황금시대를 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 농경을 바탕으로 국가를 이루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수렵채집민, 유목민은 쌍둥이 같은 것이다.
이제 우리의 토대를 찾아 먼 선사시대까지, 그리고 문헌기록을 갖지 못한 사람들까지 아우르는 역사를 써야 한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더 깊고 더 넓게 보려 애써야 한다.
제임스 스콧 지음, 전경훈 옮김, <농경의 배신> (원제: Against the grain), 책과함께, 2019.